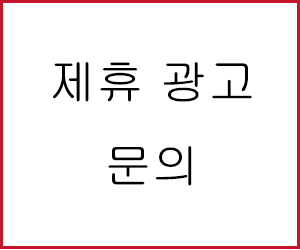야설
서른의 난 스물다섯 그를 오빠라고 부른다 - 17부
야동친구
1,891
2018.08.23 10:48
“그래. 너무 귀여워... 꼭 동생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정말 아가 같기도 하고.”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다. 방금 전 끝난 사랑의 여운이 남아서였는지 더 사랑스럽게만 느껴지는 그의 품에 살포시 안겨 난 그저 그의 통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고 있었다. 그의 절친한 친구였고 나 역시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하며 친해졌던 그 친구와의 통화는 간간히 알아들을 듯 모를 듯 이어지다 어느새 내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동갑내기 그들에게 다섯 살 연상의 내가 동생처럼 불리는 것은 여전히 나를 쑥스럽게 했지만 그런 그들의 솔직한 대화는 언제나 나를 미소 짖게 했다.
자신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더욱 빛나고 있는 그들에게서 사랑을 맘껏 뽐내고 싶었던 이십대의 나를 볼 수 있었지만 가끔은 너무 솔직한 그들의 대화가 나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허물없는 친구라고는 하지만 그는 아무거리낌 없이 자신의 친구에게 성숙한 내 몸이 주었던 환희를 그리고 사랑이 끝난 후 벌거벗은 채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내 몸을 이야기하는 지금은 더더욱 그러했다. 더구나 잠시 후 그들 커플과 마주해야하는 내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의 짓궂은 미소처럼 그의 친구도 벌거벗은 내 모습을 상상 속에 그리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아이. 오빠. 준성 오빠한테 그런 말하면 어떻게 해.”
행여 수화기 너머로 들릴까 작은 목소리로 민망한 내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전하는 우리의 은밀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를 내게 주고 있었다. 비록 내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다섯 살 연상의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감추지도 않았고 그대로의 나를 젊은 그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히려 내겐 감추어야 했던 우리의 사랑을 축복 속에 드러내주었다는 고마움 그리고 쑥스럽지만 그의 품에 알몸으로 안겨있을 수 있는 그의 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행복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마음을 그도 알고 있는 듯했다. 쑥스럽지만 행복해하는 나를 다시 꼭 안아주는 그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나만의 연인이었고 달콤한 그의 입맞춤은 행복을 확인하고 싶은 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친구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아마 내 스스로 그의 여자임을 항상 느끼라는 배려였으리라 생각한다. 내게도 그들보다 한살 어린 막내 남동생이 있기에 그 또래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는 여간 쑥스러웠던 것이 아니었지만 오빠라 불리는 그처럼 그의 친구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여자인 내게 당연한 일이었고 그의 친구도 어느새 나를 동생처럼 대하고 있었다.
“희야. 이제 사랑 표현도 잘 하네. 정말 예쁘다.”
느지막한 오후 흐릿한 전등 아래 네 개의 맥주잔이 거품을 일으키며 부딪쳤고 난 젊은 그들의 세계에 동화되고 있었다. 스물다섯 동갑내기 그들과 스물둘의 경희 그리고 서른의 나 우린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연인에게 기대어 사랑을 이야기했고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 몇 잔의 맥주가 비워지며 우린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기 시작했고 나또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는 젊은 그들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다시 몇 잔의 맥주가 돌아가고 있을 때 어느새 우린 서로의 연인에 안겨 진한 입맞춤을 하고 있었고 그런 내 모습을 그의 친구는 아름답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스물둘의 경희를 부러워했던 내 마음 속엔 어쩌면 나또한 그녀처럼 내 스스로 그의 여자임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나이 때문에 망설였던 금기가 깨어지고 나서야 서른의 난 스물둘의 그녀처럼 단지 스물다섯의 남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길 원하는 여자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와 난 같은 스물다섯 남자의 여자일 뿐이었고 우리는 자신의 예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가고 있었다.
“언니. 우리 노래방 가요. 오늘은 늦었다고 빼기 없기.”
붙임성 있고 발랄한 스물둘의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난 자꾸만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섯 살 연상의 날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도 젊고 싱그러운 그녀처럼 또래들과 젊음을 나누며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에 언제나 미안해했고 또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가 고마울 뿐이었다. 우리는 마지막 술잔을 부딪쳤고 노래방으로 향하는 그의 곁엔 꼬옥 팔짱을 낀 내가 따르고 있었다. 벌써 집으로 향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서른의 날 사랑해주는 고마운 그를 혼자 남게 할 수 없었다.
언제나 한껏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스물둘 경희의 몫이었다. 신나는 음악과 경쾌한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했고 색색의 현란한 조명은 그녀의 젊음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다시 우리는 술잔을 마주했고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서로의 연인을 마주한 우리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끈끈한 블루스 곡이 불러지고 있을 때쯤엔 우린 서로의 연인에 안겨 진한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 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사랑은 더 이상 감추어야할 허물이 아니었다.
“오빠. 사랑해요.”
속삭이듯 말하고 눈을 감았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는 의미였고 그것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다. 어깨를 감싸 안았던 그의 손길이 깊게 파인 나시 안으로 파고들었고 그대로 브레이저 속의 젖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었지만 뿌리칠 이유가 없었다. 술김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저기 한켠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다른 젊은 연인들처럼 나또한 사랑받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난 스물다섯의 한 남자에게 사랑받길 원하는 여자일 뿐 다른 그 무엇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뒤에서 날 감싸 안고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그의 숨결이 뜨겁다고 느껴졌을 때 거칠어진 그의 손길에 브레이저는 더 이상 가슴을 가려주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내 입술에 그의 입술이 포개어졌고 그의 달콤한 혀는 내 몸의 감각을 어둠 속에서 다시 일깨우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목을 따라 내려가고 천장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색색의 조명처럼 내 기분도 그렇게 빙빙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어깨끈 마자 흘러 내려지고 그의 입술은 어둠 속에 드러난 탐스러운 젖가슴의 유혹에 빠져 들었다.
“희야 가슴 섹시했었네. 우리 경희는 언제 저렇게 크지.”
나를 그리고 드러난 내 젖가슴을 그의 친구 준성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곁엔 들어 올려진 티 아래로 봉긋한 젖가슴과 단추와 지퍼가 열린 청바지 사이로 살짝 분홍 속옷을 보이고 있는 경희가 있었지만 그녀도 그리고 나도 부끄럽진 않았다. 우린 서로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있는 사랑에 빠진 여자들이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에게 그의 여자라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 젖가슴을 드러낸 아름다운 여자들이었다.
비록 내 남자는 아니었지만 준성의 눈길이 그리고 준성의 그 말이 싫진 않았다. 나보다 훨씬 어린 경희를 소유했지만 활짝 피어난 성숙한 내 몸을 탐스럽게 바라보는 준성은 오히려 내게 안도를 주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그보다 다섯 살 연상이라는 이유로 내가 가져야 했던 막연한 미안함과 혹시 그도 또래의 풋풋함과 싱그러움에 끌려 눈길을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언제나 앞섰던 내게 준성은 그 또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해주고 있었다. 벗은 내 몸에 대해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듣고 있었다.
“희야. 또 졌네. 이제 팬티 벗을 차례야.”
시간은 벌써 아홉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지만 젊은 그들에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내게도 못 다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들을 따라 나선 곳은 복층으로 이루어진 모텔이었고 하루 밤을 같이 보내기로 약속되어 있는 듯 젊은 연인의 손에 양손 가득 맥주가 들려 있었다. 게임을 곁들인 술자리가 다시 이어졌고 벌주가 옷을 벗는 벌칙으로 바뀌었을 때 난 이미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 난 그들 앞에서 스물다섯 한 남자를 사랑하는 서른의 성숙한 몸을 드러내고 또 그와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젖가슴을 드러낸 채 그의 품에 안겨있던 내게 또 벌칙이 주어졌고 그의 친구 준성은 내게 마지막 속옷을 벗으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를 돌아보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사랑스러운 그의 미소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취해가고 있었지만 우리를 취하게 한건 술이 아니라 사랑과 젊음이었고 벗겨져 내린 손바닥보다도 작은 팬티 속에는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가 되었다. 아무런 가식도 걸치지 않은 채 그저 스물다섯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다.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다. 방금 전 끝난 사랑의 여운이 남아서였는지 더 사랑스럽게만 느껴지는 그의 품에 살포시 안겨 난 그저 그의 통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고 있었다. 그의 절친한 친구였고 나 역시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하며 친해졌던 그 친구와의 통화는 간간히 알아들을 듯 모를 듯 이어지다 어느새 내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동갑내기 그들에게 다섯 살 연상의 내가 동생처럼 불리는 것은 여전히 나를 쑥스럽게 했지만 그런 그들의 솔직한 대화는 언제나 나를 미소 짖게 했다.
자신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더욱 빛나고 있는 그들에게서 사랑을 맘껏 뽐내고 싶었던 이십대의 나를 볼 수 있었지만 가끔은 너무 솔직한 그들의 대화가 나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허물없는 친구라고는 하지만 그는 아무거리낌 없이 자신의 친구에게 성숙한 내 몸이 주었던 환희를 그리고 사랑이 끝난 후 벌거벗은 채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내 몸을 이야기하는 지금은 더더욱 그러했다. 더구나 잠시 후 그들 커플과 마주해야하는 내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의 짓궂은 미소처럼 그의 친구도 벌거벗은 내 모습을 상상 속에 그리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아이. 오빠. 준성 오빠한테 그런 말하면 어떻게 해.”
행여 수화기 너머로 들릴까 작은 목소리로 민망한 내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전하는 우리의 은밀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를 내게 주고 있었다. 비록 내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다섯 살 연상의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감추지도 않았고 그대로의 나를 젊은 그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히려 내겐 감추어야 했던 우리의 사랑을 축복 속에 드러내주었다는 고마움 그리고 쑥스럽지만 그의 품에 알몸으로 안겨있을 수 있는 그의 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행복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마음을 그도 알고 있는 듯했다. 쑥스럽지만 행복해하는 나를 다시 꼭 안아주는 그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나만의 연인이었고 달콤한 그의 입맞춤은 행복을 확인하고 싶은 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친구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아마 내 스스로 그의 여자임을 항상 느끼라는 배려였으리라 생각한다. 내게도 그들보다 한살 어린 막내 남동생이 있기에 그 또래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는 여간 쑥스러웠던 것이 아니었지만 오빠라 불리는 그처럼 그의 친구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여자인 내게 당연한 일이었고 그의 친구도 어느새 나를 동생처럼 대하고 있었다.
“희야. 이제 사랑 표현도 잘 하네. 정말 예쁘다.”
느지막한 오후 흐릿한 전등 아래 네 개의 맥주잔이 거품을 일으키며 부딪쳤고 난 젊은 그들의 세계에 동화되고 있었다. 스물다섯 동갑내기 그들과 스물둘의 경희 그리고 서른의 나 우린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연인에게 기대어 사랑을 이야기했고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 몇 잔의 맥주가 비워지며 우린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기 시작했고 나또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는 젊은 그들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다시 몇 잔의 맥주가 돌아가고 있을 때 어느새 우린 서로의 연인에 안겨 진한 입맞춤을 하고 있었고 그런 내 모습을 그의 친구는 아름답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스물둘의 경희를 부러워했던 내 마음 속엔 어쩌면 나또한 그녀처럼 내 스스로 그의 여자임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나이 때문에 망설였던 금기가 깨어지고 나서야 서른의 난 스물둘의 그녀처럼 단지 스물다섯의 남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길 원하는 여자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와 난 같은 스물다섯 남자의 여자일 뿐이었고 우리는 자신의 예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가고 있었다.
“언니. 우리 노래방 가요. 오늘은 늦었다고 빼기 없기.”
붙임성 있고 발랄한 스물둘의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난 자꾸만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섯 살 연상의 날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도 젊고 싱그러운 그녀처럼 또래들과 젊음을 나누며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에 언제나 미안해했고 또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가 고마울 뿐이었다. 우리는 마지막 술잔을 부딪쳤고 노래방으로 향하는 그의 곁엔 꼬옥 팔짱을 낀 내가 따르고 있었다. 벌써 집으로 향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서른의 날 사랑해주는 고마운 그를 혼자 남게 할 수 없었다.
언제나 한껏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스물둘 경희의 몫이었다. 신나는 음악과 경쾌한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했고 색색의 현란한 조명은 그녀의 젊음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다시 우리는 술잔을 마주했고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서로의 연인을 마주한 우리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끈끈한 블루스 곡이 불러지고 있을 때쯤엔 우린 서로의 연인에 안겨 진한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 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사랑은 더 이상 감추어야할 허물이 아니었다.
“오빠. 사랑해요.”
속삭이듯 말하고 눈을 감았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는 의미였고 그것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다. 어깨를 감싸 안았던 그의 손길이 깊게 파인 나시 안으로 파고들었고 그대로 브레이저 속의 젖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었지만 뿌리칠 이유가 없었다. 술김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저기 한켠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다른 젊은 연인들처럼 나또한 사랑받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난 스물다섯의 한 남자에게 사랑받길 원하는 여자일 뿐 다른 그 무엇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뒤에서 날 감싸 안고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그의 숨결이 뜨겁다고 느껴졌을 때 거칠어진 그의 손길에 브레이저는 더 이상 가슴을 가려주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내 입술에 그의 입술이 포개어졌고 그의 달콤한 혀는 내 몸의 감각을 어둠 속에서 다시 일깨우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목을 따라 내려가고 천장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색색의 조명처럼 내 기분도 그렇게 빙빙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어깨끈 마자 흘러 내려지고 그의 입술은 어둠 속에 드러난 탐스러운 젖가슴의 유혹에 빠져 들었다.
“희야 가슴 섹시했었네. 우리 경희는 언제 저렇게 크지.”
나를 그리고 드러난 내 젖가슴을 그의 친구 준성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곁엔 들어 올려진 티 아래로 봉긋한 젖가슴과 단추와 지퍼가 열린 청바지 사이로 살짝 분홍 속옷을 보이고 있는 경희가 있었지만 그녀도 그리고 나도 부끄럽진 않았다. 우린 서로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있는 사랑에 빠진 여자들이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에게 그의 여자라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 젖가슴을 드러낸 아름다운 여자들이었다.
비록 내 남자는 아니었지만 준성의 눈길이 그리고 준성의 그 말이 싫진 않았다. 나보다 훨씬 어린 경희를 소유했지만 활짝 피어난 성숙한 내 몸을 탐스럽게 바라보는 준성은 오히려 내게 안도를 주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그보다 다섯 살 연상이라는 이유로 내가 가져야 했던 막연한 미안함과 혹시 그도 또래의 풋풋함과 싱그러움에 끌려 눈길을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언제나 앞섰던 내게 준성은 그 또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해주고 있었다. 벗은 내 몸에 대해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듣고 있었다.
“희야. 또 졌네. 이제 팬티 벗을 차례야.”
시간은 벌써 아홉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지만 젊은 그들에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내게도 못 다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들을 따라 나선 곳은 복층으로 이루어진 모텔이었고 하루 밤을 같이 보내기로 약속되어 있는 듯 젊은 연인의 손에 양손 가득 맥주가 들려 있었다. 게임을 곁들인 술자리가 다시 이어졌고 벌주가 옷을 벗는 벌칙으로 바뀌었을 때 난 이미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 난 그들 앞에서 스물다섯 한 남자를 사랑하는 서른의 성숙한 몸을 드러내고 또 그와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젖가슴을 드러낸 채 그의 품에 안겨있던 내게 또 벌칙이 주어졌고 그의 친구 준성은 내게 마지막 속옷을 벗으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를 돌아보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사랑스러운 그의 미소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취해가고 있었지만 우리를 취하게 한건 술이 아니라 사랑과 젊음이었고 벗겨져 내린 손바닥보다도 작은 팬티 속에는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가 되었다. 아무런 가식도 걸치지 않은 채 그저 스물다섯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