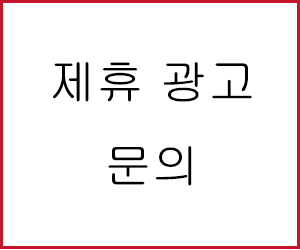야설
대리운전 - 7부 2장
야동친구
1,780
2018.09.12 19:47
[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원하면서도
진정 그 원하는 것을 막상 갖게 되었을때
오히려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
끝이 났다기 보다는
술에 취하고 피로에 지쳐서
그만 거기서 중단하고 말았다.
낮에 들여논 이사짐 박스를 하나 둘 씩 풀어 옮기고
정리하고 치우고 하느라 몸이 많이 피곤했을 터이다.
그녀는 마침내 연거푸 하품을 했다.
- 그래.... 오늘은 이만 하고 자자....
난 그녀의 고인 눈물을 깨쳐 주었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겨우 내게 의지해서 일어났다.
그러다 그냥 땅바닥에 와락 무너지듯 주저 앉았다.
그녀의 허리를 잡아 올리고
겨우 그녀를 세워서 걸려서 밀고 방으로 갔다.
참 이상했다.
마치 신혼 기분 같을거라고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최소 그 근사치 정도는 갈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그녀가 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오히려 서먹해졌다.
그녀는 내 침대 한켠에서
발까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새끈새끈
아주 조용하게 잠을 잤고.
잠결에 내가 조금 뒤척일 때도..
어쩌다 돌아서서 발을 제 몸에 얹어도
그녀는 꼼짝안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
가만 누워 있자면
그녀는 빤히 눈을 뜨고
내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것도 같았고...
그러다 그냥 가만히 눈을 스르르 감고 잠을 청하는것 같았다.
주말에 운전하는 일을 마치고 밤 늦게 들어 와도
그녀는
침대에서 무릎을 끌어 안고 벽을 기댄채
그냥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
내가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커피를 내려서 갖다 주어야만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다.
뭐 그녀가 집에 와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난 평소 살아온대로 생활했다.
침대를 나누어 쓰기에 좀 불편하긴 했지만
내가 워낙 잠들면 그냥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자는 스타일이라
특별히 달라질 게 없었다.
아니
특별히 달라진 삶이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느낌이 없어져 버렸다.
그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전철을 타고
그렇게 매일 영어학원엘 갔고
마칠 시간이 다되면
학원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담배 한가치 거의 다 피울 무렵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아무 말도 없이 자동차에 올라 탔다.
주말 저녁에는 차를 운전하러 나가는 내게
그녀는 잘 다녀오라는 말 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내 쪽으로 얼굴 한번 돌려주지 않았다.
집안과 부엌은 늘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침대 시트도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세탁기에 집어 던져 넣은 셔츠도
잘 다려져서 옷장에 걸려 있었다.
그러면서
거실에서 풀어 헤쳐진 이사짐 박스들이
하나 둘 씩 사라져 가고
마침내 빈 박스들만 한켠에 수북히 쌓일 무렵에
그녀는 드디어 한 마디를 건냈다.
- 저기... 박스좀 치워줘요...
- 응.... 그래..
박스를 반듯하게 맞추어서 묶고
마침 근처에 짐 배달 오는 차 편이 있어서 그편에 창고로 보냈다.
- 갑자기 거실이 텅 비었네....
- 가구를 좀 사야 할것 같은데....
- 오후에 좀 나가서 둘러 볼까?... 뭘 살건데?
- 응.... 책상하고....
- 그래... 저쪽에 가면 가구점들이 많이 있거든...
- 아니.. 가구점까지 갈건 없을것 같애...
그냥 책 좀 들여다 볼 책상인데뭐...월마트나 오피스디포엘 가보지...
- 그리고 딴건 필요 없어?
- 뭐?
- 다른 가구 필요 없냐구?
- 응... 다른거 뭐 필요한거 없어...
- 침대 안필요해?
- 왜?
- 불편해 하는것 같애서..
- 아냐... 난 반평 내 자리만 있으면 잘자....
어머? 당신이 불편해 하는거 아냐?
- 아니.... 뭐 불편할 것까진 없어..
나야 그대로 누었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 근데 왜 침대가 안필요하나고 물어?
- 아니... 그냥..
- 필요할까?
- 뭐...
- 아니... 필요없다는거 잘 알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듯했지만 왠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 아... 그거 하나 사 줄까 생각했지..
- 뭐?
- 있어... 나중에 알켜줄께.
- 뭔데?
- 어허... 다쳐... 거기까지만!
- 알았어요..
그녀는 뒤돌아 서서 물었다.
- 배 안고파요?
- 응... 좀 고픈데...
- 나가서 뭘 좀 사먹을까요?
- 그럴까?
- 아참! 책상을 살 필요는 없겠는데?
- 왜?
- 전번에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사짐 싸면서 괜찮은 책상이 있었어..
꽤 괜찮은 거라서 비싸게 팔고 가려다가
결국 시간이 없어서 못팔고 갔지.
이삿짐 싸다가 그거 남아서 창고에 둔게 있을거야..
한번 봐... 괜찮아...기역자로 된 건데...
- 그래?
- 짜장면 한그릇 먹고 사무실에 가보자. 지금 창고에 있을거야.
- 알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미스최가 눈을 휘둥그레 뜬다.
- 어머! 어서 오세요...
진짜로 미인이시네요...키도 크~~~고!
그녀는 가볍게 눈 인사를 했다.
- 사장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 하시던데..
- 사장님요? 어뜬...?
박사장이 안쪽에서 걸어 나오면서 우리랑 딱 눈이 마주쳤다.
갑자기 그녀가 내 뒤로 몸을 감추었다.
- 어머머... 저사람이야! 저사람!
- 뭘?
그녀는 순간 상황을 눈치채고 아주 얼굴이 빨개졌다.
- 야! 박사장! 니가 얼마나 끈적끈적한 눈으로 쳐다 봤으면
울 애인이 이렇게 깜짝 놀라 숨냐?
저식키 또 침흘리는거 보게~~
박사장은 손을 내민다.
- 아이고 계수씨! 어디 악수나 좀 합시다.
그녀는 마지 못해서 손을 내민다.
- 아이고... 손도 곱네~~
대충 이제 눈치 채시겠죠?
- 아... 네! 그날은 정말 당황했죠...
- 허허허.. 이 눔이 원래 엉뚱한 데가 있어!
박사장은 말을 슬쩍 돌린다.
- 책상 보시러 오셨다고?
- 네....
- 상태는 전에 보니까 괜찮던데..
- 응.. 그거 원래 체리목이라서 색깔도 기가 막히고 워낙 튼튼해.
주인이 그거 비싸게 주고 산거라서 왠만한 가격으로는 팔고 가야 한다고
고집피우다가 결국 그냥 놓고 갔지 뭐..
어디다 들여다 놓기가 좀 그래서...
박사장은 우리를 창고로 안내했다.
먼지를 털어낸 책상은 그런대로 상태가 양호했다.
- 색깔이 무척 곱네요..
- 그게 무슨 브라질 산 체리목이래요. 워낙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서
아주 고급 가구에만 사용한대나?
- 이걸 그냥 주신다구요?
그녀가 대뜸 말을 던졌다.
박사장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갑자기 더듬는다.
- 그거 이사짐 비용 일부로 받은건데..
- 이눔이... 이걸 돈받아 먹을라고 그러냐?
진짜 도적놈이 따로 없네..
- 아니.. 그게 아니고.. 계수씨가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 가셔야지...
박사장은 뒤통수를 긁으며 괜히 입맛을 다신다.
- 이왕 배달도 좀 해주라!
-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 야! 요새 내가 허리가 좀 안좋아서..
- 아주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네 이눔이 허리가 아프다고?
박사장은 헛기침을 하면서 창고에서 앞서 나간다.
- 맘에 들어?
- 응... 괜찮아 보이네..
박사장은 미스최를 향해 소리쳤다.
- 저기말야.. A 팀 들어오면 퇴근하면서 저 책상 갖다 내버리라고 해!
- 김이사님 집에다 버리라고 해요?
미스최가 싱글 싱글 웃으면서 말을 받아 준다.
- 버리든지 말든지!
그녀가 그소리를 듣고 깔깔거리며 웃는다.
(참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웃음소리다.)
- 시아주버님! 제가 나중에 한번 쏠께요!
박사장은 연거푸 헛기침만 해 댄다.
- 자슥아! 시아주버니 소리도 듣고 오늘 완전 뜨네...
- 오늘 시아주버니 한번 아주 비싸게 값치르네~~
- 이 의자는 어때?
그녀는 날 빤히 쳐다 보았다.
- 이 흔들의자 어떠냐고?
- 이런거 사준다고 했어요?
- 응...
- 왜요?
- 맘에 들어?
- 이쁜데...
그녀는 의자에 앉아 본다.
- 생각보다 편하네....
- 이렇게 레버를 제끼면 흔들거리지..
그녀는 잠깐 흔들 의자에 앉아서 발장난을 쳤다.
- 진짜 이거 사줄거야?
- 그래!
가구집 주인은 창고에 재고가 없어 따로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
그냥 이걸 집어가면 어떠나고 물었더니..
전시품이라 가격을 좀 할인해 준다고 친절을 베푼다.
난 값을 치르고 전화를 걸었다.
- 박사장! 이따가 책상 갖고 가는 팀들한테 말해서
여기 흔들의자 하나 더 싣고 가라고 해라!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 와서
저녁을 먹고 나서..
책상과 의자가 도착했다.
책상은 방 한쪽 모서리에 기역자로 잘 맞추어서 놓았다.
한 모서리는 벽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모서리는 키 높은 창에 대어졌다.
- 흔들의자는 어디다 놓을까?
- 여기... 창가가 좋겠어.
난 거실 창가를 가리켰다.
그날밤.
그녀는
내게 팔베게를 해 달라고 했다.
- 왜 흔들의자를 사줄 생각을 했어요?
- 응? 그냥...
- 왜.. 흔들의자가 좋아 보였어요?
- 아니.. 뭐... 당신만의 뭔가가 필요한거 아냐?
당신 거기 앉아서...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그리고 가끔 거기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편하게 걸칠 곳이 필요해..
그녀는 내 턱에 바짝 얼굴을 대었다.
- 고마워요... 내 생각 해줘서...
그녀는 살짝 내게 입술을 내 밀었다.
비로소
우리 둘 사이에
갑자기 생겨났던 그 무언가의 어색함이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얼굴을 내 턱에 계속 비볐다
콧날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의 미끈한 입술이
잠깐 내 목덜미를 빨고 지나갔다.
혀를 날름 거리면서..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껴안았다.
그녀는 내게 몸을 향해 돌렸다.
그녀의 다리 한쪽이 내게로 들어왔다.
- 여기가 좋아... 내자리야...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내 다리 사이에 그녀의 다리를 하나 밀어 넣었다.
- 부드럽지?
- 아니 뼈가 부닥쳐서 딱딱해! 크크..
나는 하체를 밀착시켰다.
- 아...
그녀의 입에서 가벼운 신음소리가 터졌다.
손을 뻗어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 쥐고 바짝 끌어 당겼다.
그녀는 내 목을 껴안았다.
- 나... 힘들었어...
당신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 많이 했어...
인제... 괜찮아...
당신이 날 필요로하는거 깨달았어...인제...괜찮아...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 사랑할까?
-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자
그녀는 내게 다리를 넓게 벌려 주었다.
[ 내년 봄에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것과 수리해야 하는 것과
이런 장비 문제로 오늘은 하루 종일 장비담당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는 장비를 대부분 리스해서 쓰기 때문에
장비를 정말 험하게 잡아 돌립니다.
고장나면 다른 장비 갖다 돌리면 되니까요..
한국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이런 구호 따윈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원하면서도
진정 그 원하는 것을 막상 갖게 되었을때
오히려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
끝이 났다기 보다는
술에 취하고 피로에 지쳐서
그만 거기서 중단하고 말았다.
낮에 들여논 이사짐 박스를 하나 둘 씩 풀어 옮기고
정리하고 치우고 하느라 몸이 많이 피곤했을 터이다.
그녀는 마침내 연거푸 하품을 했다.
- 그래.... 오늘은 이만 하고 자자....
난 그녀의 고인 눈물을 깨쳐 주었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겨우 내게 의지해서 일어났다.
그러다 그냥 땅바닥에 와락 무너지듯 주저 앉았다.
그녀의 허리를 잡아 올리고
겨우 그녀를 세워서 걸려서 밀고 방으로 갔다.
참 이상했다.
마치 신혼 기분 같을거라고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최소 그 근사치 정도는 갈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그녀가 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오히려 서먹해졌다.
그녀는 내 침대 한켠에서
발까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새끈새끈
아주 조용하게 잠을 잤고.
잠결에 내가 조금 뒤척일 때도..
어쩌다 돌아서서 발을 제 몸에 얹어도
그녀는 꼼짝안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
가만 누워 있자면
그녀는 빤히 눈을 뜨고
내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것도 같았고...
그러다 그냥 가만히 눈을 스르르 감고 잠을 청하는것 같았다.
주말에 운전하는 일을 마치고 밤 늦게 들어 와도
그녀는
침대에서 무릎을 끌어 안고 벽을 기댄채
그냥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
내가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커피를 내려서 갖다 주어야만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다.
뭐 그녀가 집에 와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난 평소 살아온대로 생활했다.
침대를 나누어 쓰기에 좀 불편하긴 했지만
내가 워낙 잠들면 그냥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자는 스타일이라
특별히 달라질 게 없었다.
아니
특별히 달라진 삶이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느낌이 없어져 버렸다.
그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전철을 타고
그렇게 매일 영어학원엘 갔고
마칠 시간이 다되면
학원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담배 한가치 거의 다 피울 무렵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아무 말도 없이 자동차에 올라 탔다.
주말 저녁에는 차를 운전하러 나가는 내게
그녀는 잘 다녀오라는 말 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내 쪽으로 얼굴 한번 돌려주지 않았다.
집안과 부엌은 늘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침대 시트도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세탁기에 집어 던져 넣은 셔츠도
잘 다려져서 옷장에 걸려 있었다.
그러면서
거실에서 풀어 헤쳐진 이사짐 박스들이
하나 둘 씩 사라져 가고
마침내 빈 박스들만 한켠에 수북히 쌓일 무렵에
그녀는 드디어 한 마디를 건냈다.
- 저기... 박스좀 치워줘요...
- 응.... 그래..
박스를 반듯하게 맞추어서 묶고
마침 근처에 짐 배달 오는 차 편이 있어서 그편에 창고로 보냈다.
- 갑자기 거실이 텅 비었네....
- 가구를 좀 사야 할것 같은데....
- 오후에 좀 나가서 둘러 볼까?... 뭘 살건데?
- 응.... 책상하고....
- 그래... 저쪽에 가면 가구점들이 많이 있거든...
- 아니.. 가구점까지 갈건 없을것 같애...
그냥 책 좀 들여다 볼 책상인데뭐...월마트나 오피스디포엘 가보지...
- 그리고 딴건 필요 없어?
- 뭐?
- 다른 가구 필요 없냐구?
- 응... 다른거 뭐 필요한거 없어...
- 침대 안필요해?
- 왜?
- 불편해 하는것 같애서..
- 아냐... 난 반평 내 자리만 있으면 잘자....
어머? 당신이 불편해 하는거 아냐?
- 아니.... 뭐 불편할 것까진 없어..
나야 그대로 누었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 근데 왜 침대가 안필요하나고 물어?
- 아니... 그냥..
- 필요할까?
- 뭐...
- 아니... 필요없다는거 잘 알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듯했지만 왠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 아... 그거 하나 사 줄까 생각했지..
- 뭐?
- 있어... 나중에 알켜줄께.
- 뭔데?
- 어허... 다쳐... 거기까지만!
- 알았어요..
그녀는 뒤돌아 서서 물었다.
- 배 안고파요?
- 응... 좀 고픈데...
- 나가서 뭘 좀 사먹을까요?
- 그럴까?
- 아참! 책상을 살 필요는 없겠는데?
- 왜?
- 전번에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사짐 싸면서 괜찮은 책상이 있었어..
꽤 괜찮은 거라서 비싸게 팔고 가려다가
결국 시간이 없어서 못팔고 갔지.
이삿짐 싸다가 그거 남아서 창고에 둔게 있을거야..
한번 봐... 괜찮아...기역자로 된 건데...
- 그래?
- 짜장면 한그릇 먹고 사무실에 가보자. 지금 창고에 있을거야.
- 알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미스최가 눈을 휘둥그레 뜬다.
- 어머! 어서 오세요...
진짜로 미인이시네요...키도 크~~~고!
그녀는 가볍게 눈 인사를 했다.
- 사장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 하시던데..
- 사장님요? 어뜬...?
박사장이 안쪽에서 걸어 나오면서 우리랑 딱 눈이 마주쳤다.
갑자기 그녀가 내 뒤로 몸을 감추었다.
- 어머머... 저사람이야! 저사람!
- 뭘?
그녀는 순간 상황을 눈치채고 아주 얼굴이 빨개졌다.
- 야! 박사장! 니가 얼마나 끈적끈적한 눈으로 쳐다 봤으면
울 애인이 이렇게 깜짝 놀라 숨냐?
저식키 또 침흘리는거 보게~~
박사장은 손을 내민다.
- 아이고 계수씨! 어디 악수나 좀 합시다.
그녀는 마지 못해서 손을 내민다.
- 아이고... 손도 곱네~~
대충 이제 눈치 채시겠죠?
- 아... 네! 그날은 정말 당황했죠...
- 허허허.. 이 눔이 원래 엉뚱한 데가 있어!
박사장은 말을 슬쩍 돌린다.
- 책상 보시러 오셨다고?
- 네....
- 상태는 전에 보니까 괜찮던데..
- 응.. 그거 원래 체리목이라서 색깔도 기가 막히고 워낙 튼튼해.
주인이 그거 비싸게 주고 산거라서 왠만한 가격으로는 팔고 가야 한다고
고집피우다가 결국 그냥 놓고 갔지 뭐..
어디다 들여다 놓기가 좀 그래서...
박사장은 우리를 창고로 안내했다.
먼지를 털어낸 책상은 그런대로 상태가 양호했다.
- 색깔이 무척 곱네요..
- 그게 무슨 브라질 산 체리목이래요. 워낙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서
아주 고급 가구에만 사용한대나?
- 이걸 그냥 주신다구요?
그녀가 대뜸 말을 던졌다.
박사장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갑자기 더듬는다.
- 그거 이사짐 비용 일부로 받은건데..
- 이눔이... 이걸 돈받아 먹을라고 그러냐?
진짜 도적놈이 따로 없네..
- 아니.. 그게 아니고.. 계수씨가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 가셔야지...
박사장은 뒤통수를 긁으며 괜히 입맛을 다신다.
- 이왕 배달도 좀 해주라!
-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 야! 요새 내가 허리가 좀 안좋아서..
- 아주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네 이눔이 허리가 아프다고?
박사장은 헛기침을 하면서 창고에서 앞서 나간다.
- 맘에 들어?
- 응... 괜찮아 보이네..
박사장은 미스최를 향해 소리쳤다.
- 저기말야.. A 팀 들어오면 퇴근하면서 저 책상 갖다 내버리라고 해!
- 김이사님 집에다 버리라고 해요?
미스최가 싱글 싱글 웃으면서 말을 받아 준다.
- 버리든지 말든지!
그녀가 그소리를 듣고 깔깔거리며 웃는다.
(참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웃음소리다.)
- 시아주버님! 제가 나중에 한번 쏠께요!
박사장은 연거푸 헛기침만 해 댄다.
- 자슥아! 시아주버니 소리도 듣고 오늘 완전 뜨네...
- 오늘 시아주버니 한번 아주 비싸게 값치르네~~
- 이 의자는 어때?
그녀는 날 빤히 쳐다 보았다.
- 이 흔들의자 어떠냐고?
- 이런거 사준다고 했어요?
- 응...
- 왜요?
- 맘에 들어?
- 이쁜데...
그녀는 의자에 앉아 본다.
- 생각보다 편하네....
- 이렇게 레버를 제끼면 흔들거리지..
그녀는 잠깐 흔들 의자에 앉아서 발장난을 쳤다.
- 진짜 이거 사줄거야?
- 그래!
가구집 주인은 창고에 재고가 없어 따로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
그냥 이걸 집어가면 어떠나고 물었더니..
전시품이라 가격을 좀 할인해 준다고 친절을 베푼다.
난 값을 치르고 전화를 걸었다.
- 박사장! 이따가 책상 갖고 가는 팀들한테 말해서
여기 흔들의자 하나 더 싣고 가라고 해라!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 와서
저녁을 먹고 나서..
책상과 의자가 도착했다.
책상은 방 한쪽 모서리에 기역자로 잘 맞추어서 놓았다.
한 모서리는 벽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모서리는 키 높은 창에 대어졌다.
- 흔들의자는 어디다 놓을까?
- 여기... 창가가 좋겠어.
난 거실 창가를 가리켰다.
그날밤.
그녀는
내게 팔베게를 해 달라고 했다.
- 왜 흔들의자를 사줄 생각을 했어요?
- 응? 그냥...
- 왜.. 흔들의자가 좋아 보였어요?
- 아니.. 뭐... 당신만의 뭔가가 필요한거 아냐?
당신 거기 앉아서...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그리고 가끔 거기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편하게 걸칠 곳이 필요해..
그녀는 내 턱에 바짝 얼굴을 대었다.
- 고마워요... 내 생각 해줘서...
그녀는 살짝 내게 입술을 내 밀었다.
비로소
우리 둘 사이에
갑자기 생겨났던 그 무언가의 어색함이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얼굴을 내 턱에 계속 비볐다
콧날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의 미끈한 입술이
잠깐 내 목덜미를 빨고 지나갔다.
혀를 날름 거리면서..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껴안았다.
그녀는 내게 몸을 향해 돌렸다.
그녀의 다리 한쪽이 내게로 들어왔다.
- 여기가 좋아... 내자리야...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내 다리 사이에 그녀의 다리를 하나 밀어 넣었다.
- 부드럽지?
- 아니 뼈가 부닥쳐서 딱딱해! 크크..
나는 하체를 밀착시켰다.
- 아...
그녀의 입에서 가벼운 신음소리가 터졌다.
손을 뻗어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 쥐고 바짝 끌어 당겼다.
그녀는 내 목을 껴안았다.
- 나... 힘들었어...
당신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 많이 했어...
인제... 괜찮아...
당신이 날 필요로하는거 깨달았어...인제...괜찮아...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 사랑할까?
-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자
그녀는 내게 다리를 넓게 벌려 주었다.
[ 내년 봄에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것과 수리해야 하는 것과
이런 장비 문제로 오늘은 하루 종일 장비담당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는 장비를 대부분 리스해서 쓰기 때문에
장비를 정말 험하게 잡아 돌립니다.
고장나면 다른 장비 갖다 돌리면 되니까요..
한국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이런 구호 따윈 아예 없습니다.]